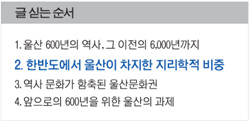
반세기 조국공업센터로 불리우던 울산
6,000년전 반구대서 이미 新문화 탄생
천년전엔 신라의 국제무역항으로 명성
600년전엔 한반도 동남쪽의 수군 요새
# 풍수지리상 한반도의 전형적 명당 구조
울산은 한반도 동남쪽에 있다. 지형은 태평양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양적(陽的)인 기운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루며 형산강 구조대로 지반이 강하게 형성돼 분지형의 울타리 구조를 이루며 풍수지리 양기명당(陽基明堂)의 이상적 지세인 동평(東坪), 남저(南低), 서북고(西北高)의 형태로 한반도의 전형적 명당구조인 삼태기 구조를 하고 있다.
1962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했다. 울산이 공업입국과 조국 근대화의 선봉장이 된 셈이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울산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본보기가 됐다.
공업도시로 발탁된 울산은 선사시대 이후부터 공업도시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그 증거가 바로 반구대암각화와 달천 철장이다. 반구대암각화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울산이 사람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증거고, 북구 달천 철장은 인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철기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였다.
울산에는 북구에 쇠부리축제가 열리고 쇠부리 문화가 하나의 문화적 자산으로 전승되고 있다. 철장은 철의 원료인 토철이나 철광석을 캐던 곳을 말하는데 울산 달천 철장은 그 기원이 무려 기원전 2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문헌 삼국지 위지 동이전과 후한서의 기록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철기 문화는 중국 한나라 이후 중국대륙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울산 북구 달천 철장의 야철장 등 유적 발굴 이후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놀라운 철기유적이 고스란히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달천 철장과 울산공업센터는 2,00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한반도 동남쪽 작은 어촌마을인 울산은 철을 발견한 부족과 그 문화를 전수받은 부족들이 들어와 새로운 철의 왕국을 만들었다. 6개의 작은 족장들로 구성된 사로국이 신라라는 이름의 고대국가로 발전하고 이들이 결국 삼국통일을 통해 한반도 세력의 중심에 선 것도 따지고 보면 달천 철장이 중심이다.
# 달천철장 발견으로 철기문화 근원지 입증
궁금한 것은 달천 철장을 발견한 세력과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에 있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삼국유사 등 현존하는 기록에 근거하면 달천 철장의 뿌리는 신라를 이끈 석탈해계로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석탈해는 단야족(鍛冶族)이라고 했는데 단야족은 야철세력을 의미한다. 석탈해는 철기술을 바탕으로 사라벌에 입성해 왕이 됐는데 그 철은 바로 이 울산의 달천 철장(達川鐵場)의 철이다. 이는 최근 달천 철장 일원에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단야족의 유구로도 확인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석탈해가 신라 귀족세력의 중심에 들어와 자신이 신라 땅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대목이다.

삼국유사에는 석탈해가 숫돌과 숯을 몰래 묻어놓고 자신의 연고권을 주장했다고 적고 있다. 숫돌과 숯은 야철문화의 상징이다. 석탈해의 등장과 초기 신라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신라가 6촌장의 연합체로 시작해 고대국가의 면모를 만들 수 있었던 바탕이 석탈해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석탈해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 한반도에 철기문화를 전달했을까. 이 문제는 아직 명확한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고대사 대부분이 명확한 사실의 기록보다는 모호한 신화나 설화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에 이를 풀이하는 학자들의 그들 나름의 잣대로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중 유력한 설이 석탈해의 북방유입설이다. 흉노의 후예인 석탈해가 왕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알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상자에 실린 채 한반도 동남부에 닿았다는 신화가 그 근거다. 난생신화는 대부분 북방민족을 이끈 영웅들의 출생담이다.
# 8세기 인구 100만의 서라벌은 세계 4대 도시
북방민족에 난생설화가 많은 것은 그들이 태양의 후예, 하늘의 자손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북방민족 대부분은 태양을 신표로 하고 태양 가까이 있는 새를 신물로 여겼다. 고구려의 삼족오나 알타이·스키타이 문화의 새문양도 여기서 비롯된다. 결국, 석탈해도 북방민족의 후예로 신라 땅에 들어와 그들이 사용했던 철기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울산 북구 달천을 그 근거지로 삼은 셈이다.
놀라운 것은 석탈해식 난생설화는 시베리아 동단, 캄차카반도부터 유라시아 중심, 알타이를 거쳐 훈족의 말발굽이 닿던 동유럽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초기 신라 왕국의 지배계층이 광활한 대륙의 후예들로 그들의 철 제련술과 철제 무기가 왕국의 튼튼한 뒷배가 됐다.
우리의 경우 고대사 부분에서 많은 사료들이 유실됐고 현존하는 사료들이 극히 부족한 탓에 석탈해와 울산, 그리고 신라의 이야기는 무슨 미스터리식 고대사로 치부됐다. 이는 석탈해의 뿌리가 울산이고 그 바탕 위에 신라가 다문화 다민족의 국제적 왕국이 됐다는 인식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라는 고대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은 세계열강의 하나였다. 그 증거가 바로 개운포에 남아 있다. 8세기 무렵 세계 4대 도시는 콘스탄티노플과 바그다드, 중국의 장안과 서라벌이었다. 당시 100만 인구가 거주한 서라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국제도시였다. 이슬람의 지리학자 이드리시나 후드라드베의 기록에 남아 있는 신라는 풍요의 땅이자 유토피아와 같았다.
문제는 지금의 시각으로 신라를 바라보는 데 있다. 고려조 김부식의 역사서 삼국사기에 의존한 우리 역사는 많은 오류를 안고 있다. 그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라에 대한 기록이다. 일제는 조선을 침탈한 이후 악랄한 방법으로 조선의 정신을 살해하려 했다. 그 작업의 한 축이 과거사에 대한 정리였고 역사서의 '분서갱유'였다.
1910년 일제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취조국을 두고서 모든 서적을 일제히 수색했으며, 다음 해 1911년 말까지 1년 남짓 동안 무려 20만 권의 서적을 강탈해갔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의하면 당시 일제는 이 땅 곳곳에서 51종 20만 권 정도의 서적을 거둬 불태우거나 본국으로 가져갔다.
그때 사라진 책 가운데 신정동국역사(新訂東國歷史)나 대동역사략(大東歷史略) 등 귀중한 역사서가 대부분이었다. 사라진 역사서를 들춰볼 순 없지만 이슬람의 기록이나 중국 역사서를 기초해 보면 8세기 무렵 신라는 우리의 상상보다 크고 웅장한 세계와 교류를 해온 국제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8세기의 시각으로 신라를 바라보고 울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 울산 개운포가 있다. 개운포는 신라가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교류의 현장이었다.
# 개운포는 신라의 국제교류 소통 창구
우리 역사에서 서역인이나 아랍인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개운포에서 시작된 역사다. 국제무역항인 개운포가 신라의 수도 서라벌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개운포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지리지인 '경상도 지리지'와 '세종실록' 등에서도 통일신라 때에 경주를 배후에 둔 산업, 상업의 중심지로서, 신라 최대의 국제무역항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운포는 아랍 상인들이 많이 와서 살던 당나라 양주(揚州)로 가는 바닷길의 신라 쪽 출발지였으며 당시 신라와 교역하고 왕래하던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은 물론, 동서교역의 주역인 아랍인들도 이용하던 국제항이기도 했다.

울산이 과거 서역과 교통하던 국제무역항일 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천 년 전의 세월로 거슬러가면 국제무역항이 있다. 그 지점에서 천 년의 세월이 지나 국제적인 물류시설이 들어서고 자유무역지대가 건설 중인 이 땅이 오래된 미래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 낯설지 않았다.
우리의 역사는 교류의 역사였고 고여서 정체된 부동의 문화보다 흘러서 교차하고 새롭게 변용하는 흐름의 문화였다. 이는 바로 신라 천 년의 에너지를 제공한 국제무역항 개운포의 역동성이 원천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도시계획 전문가 이케다 사다오가 울산 공업센터 구상을 주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울산의 오늘을 있게 한 근본은 바로 석탈해로 시작되는 북방의 철기 문화였다. 이를 근거로 울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읽어야 오늘의 역사와 내일의 울산을 그려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울산의 유구한 역사 되짚어볼 전환점 돼야
울산은 반세기의 공업센터 역사나 조국 근대화의 일번지가 전부는 아니다. 이미 6,000년에서 7,000년 전 이 땅에서는 해양문화와 북방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천 년 전에는 통일신라의 가장 중요한 국제무역항이었다.
그뿐인가. 고려 이후 수군의 거점지역으로 해군항의 역할을 해온 것이 울산이고 600년 전 오늘 울산의 이름을 부여받고 경상좌도의 중심으로 한반도 동남쪽의 요새가 됐던 곳이 울산이다. 그런 울산이 눈앞의 근대화 역사로 평가되는 일은 불행하다. 반세기의 역사가 비록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자 산업수도를 이끈 영광의 시간이었다 해도 그것이 울산 전부는 아니다.
반세기 전 울산에 모여든 대부분 시민이 새로운 울산의 주인이 된 튼튼한 내공을 가진 도시다. 반구대암각화로부터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에 이르는 수천 년 세월이 강을 따라 흐르는 도시가 울산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울산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 울산의 역사와 문화는 현대화 이전의 울산, 즉 역사성을 더듬어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작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하나씩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바로 올해가 울산이라는 이름을 받은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600년의 의미는 단순한 기록의 의미를 넘어 울산의 역사성을 부각하고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묶는 새로운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라지고 없어진 지역의 역사문화자료를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일부터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 그래야 왜곡된 울산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영 편집국장

